빛바랜 사진 혹은 오래된 그리움 같은 곳, 만주 인문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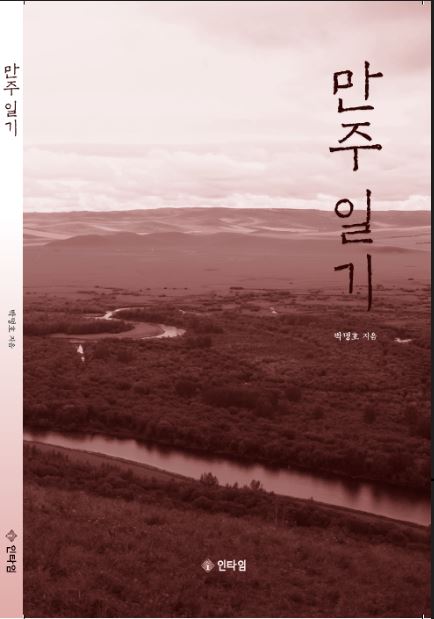
만주일기 표지
[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만주 일기’는 관광 명소를 찾아다며 그 감흥을 적은 여느 기행문과는 다르다. 우리가 잊어버린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를 찾아가는 인문 기행이다.
두만강과 압록강 너머 공간에 ‘만주’라는 오래된 호칭으로 우리의 과거가 살아 있다. 그 곳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핏줄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이지만 우리의 디아스포라이다. 이 책은 만주 일대에 살아가는 조선족을 만나 그들의 어제와 오늘을 들춰보고, 그들의 삶과 애환을 소설가 특유의 감성으로 생생하게 담은 기록이다.
저자는 청소년 시절 멀리서 전파 타고 넘어오는 연변라지오방송을 들으면서 그곳에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도라지, 아리랑을 부르는 우리 동포가 산다는 것이 신기했고, 그리고 동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만주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살아 있는 현재의 역사라는 것이 살 떨리는 감흥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갈 수 없는 죽의 장막 저 쪽의 땅이다.
성인이 돼서도 ‘만주 열병’을 앓던 저자는 중국과 국교가 수립된 이후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마치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에 이끌린 듯 한 두 해 걸러 한 번씩 만주를 찾았다. 찾은 곳은 단동·봉성·심양·연길·용정·삼합·개산툰·이도백하·백두산·장백·연길·훈춘·도문·목단강·하얼빈·길림 등으로 조선족이 거주하는 만주(중국 동북3성) 전역을 아우른다. ‘만주 일기’는 20여 년 간의 여정을 일간지 국제신문과 웹진 인저리타임에 연재한 기행문 ‘만주 일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만주 일기’ 내용 중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하기 월북’ 사건도 들어 있다. 1996년 마침내 연변작가들과 부산작가들의 공동문집 ‘두만강 여울소리, 낙동강 갈대소리’를 발간을 했다. 그리고 출간 행사를 연길에서 거행하기로 하고 행사와 관광을 겸해서 부산에서 90여 명의 작가와 독자들이 연변을 방문했다.
개방 초기였던 당시, 작가들 간 교류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경계가 심했다. 설상가상 동료 작가 김하기가 술김에 두만강을 건너 월북하는 바람에 상황이 심각해졌다. 행사는 불허되고 공동문집 배포는 금지됐다. 많은 돈을 들여 힘들게 가져간 책을 그냥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했다. 수습한다고 혼자 남아 있었지만 그 사건은 이미 남북한과 중국의 국가 간의 문제로 커져버렸다.
저자는 20여 년간 만주를 다녀오면서 흑백사진 같았던 그곳의 세태변화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흑백사진 같은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스무 해가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이 만주 아니 중국도 많이 변했다. 특히 한국행 붐과 조선족 사회의 급격한 붕괴를 지켜봤다. 아마 조만간 만주에 만주족이 없는 것처럼 조선족, 조선 문화도 곧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만주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없는 흑백 사진 같은 그리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연도 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시간이 나면 그곳에 간다.’

박명호 작가
초기작 ‘가롯의 창세기’와 교육소설 ‘또야, 안뇨옹’는 종교와 현실문제 다룬 장편소설로 자유분방한 작가의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 그 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단편들을 묶은 소설집 ‘우리 집에 왜 왔니’ ‘뻐꾸기뿔’ 등은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과 서정성으로 운문 같은 소설의 경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