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성장통? 고객은 울화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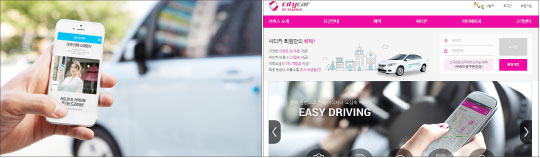
최근 카셰어링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스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쏘카’ 모바일(왼쪽)과 ‘씨티카’ 홈페이지 화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셰어링업체는 ‘쏘카’ ‘그린카’ ‘씨티카’ ‘유카’ 등이다. 카셰어링과 렌터카의 가장 큰 차이는 업체 측 직원의 유무다. 카셰어링은 주로 스마트폰 앱(PC도 가능)으로 대여하고, 픽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카드로 문을 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요금이 저렴하다. 대신 사고 시 케어해 줄 직원이 없어 이용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사고처리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국내 최대 포털 첫 화면에서 ‘카쉐’까지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추천으로 뜨는 어구의 첫 번째가 ‘카쉐어링’이고 두 번째가 ‘카쉐어링 사고’다. 사고처리가 이용자의 몫이다 보니 관련 정보에 관심이 크고, 실제 사례도 화면이 넘칠 정도로 많이 나온다. 이들 중 이용자 A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연이 구구절절하다.
A 씨가 B 업체 차량을 대여한 곳은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근처다. 이런 곳에는 카셰어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요금 싼 곳을 찾다 보면 허름한 빌딩에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곳인 경우가 많다. A 씨는 승강기에서 나온 차(액센트)를 픽업해 좁은 주차장길을 돌아 나오다 벽에 사이드미러를 부딪쳤다. 덜렁거리는 사이드미러에 당황한 A 씨는 B 업체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콜센터 직원은 “가장 가까운 공업사를 안내해 주겠다”며 한참 먼 구로구 독산동 소재 업체를 소개했다. 사고에 놀란 A 씨는 직접 운전하는 대신 견인차를 불렀다. 견인요금은 본인부담이라 5만 원을 직접 지불했다. 금요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해당 공업사는 “오늘은 영업이 끝났고 월요일에 문을 연다”고 말했다. 휴차료(수리 등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일수만큼의 손해액을 무는 것)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한 A 씨는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휴차료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양재동에 있는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를 했고, B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수리를 염두에 두고 대여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린 A 씨는 다음날 11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한 뒤 차를 반납했다. A 씨는 블로그에서 “24시간 내에 수리를 마쳐 휴차료가 나오지 않아 나름 선방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왜 주말 동안 문을 닫은 공업사로 안내를 했는지 허탈했다”고 털어놓았다.
또 하나 A 씨를 허무하게 만든 것은, 연속으로 24시간을 대여하면 50% 할인이 적용돼 이용료가 7만 원이지만, 분할해서 24시간을 신청하면 할인 적용이 안 돼 14만 원을 내야 했다는 점이다. A 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시간을 연장한 것인데, 왜 할인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A 씨가 ‘나름 선방했다’고 여긴 것은 휴차료 때문이다. 블로거 C 씨의 사례를 보면 휴차료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C 씨는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기아자동차 레이를 대여했다가 차 대 차 사고를 냈다.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차축이 틀어져 타이어가 흙받이에 닿은 상태였다. 견인료를 부담하고 지정 공업사로 입고시킨 C 씨는 다음날 80만 원이 넘는 수리견적서를 받았다. 카셰어링 업체로부터는 면책금(사고당 최대 50만 원)에 4일 휴차료 13만 2000원이 부과됐다. 수리는 3일 만에 완료됐지만, 4일째 테스트 운전을 해 봐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치가 더 부과된 것이다. C 씨는 업체 측에 항의한 끝에 휴차료를 3일치인 9만 9000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유카’(왼쪽)와 ‘그린카’ 홈페이지 캡처.
카셰어링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은 사고 시 안내와 처리가 원활치 못하다는 점이다. 이용자 D 씨의 경우, 간단한 접촉 사고 후 카셰어링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ARS(자동응답) 답변만 반복될 뿐 직원과 통화를 하지 못했다. 결국 한 시간 뒤에야 통화가 이뤄졌지만, 돌아온 것은 “왜 이제야 전화를 했느냐”는 타박뿐이었다. ARS 안내 음성을 들으며 대기한 한 시간 이상의 통화요금을 부담한 것도 D 씨였지만.
이처럼 사고 처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카셰어링 업체는 일종의 ‘스타트업’ 기업이다. 스타트업의 특징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한 뒤, 이용자가 늘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 사업모델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티켓몬스터, 쿠팡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인력과 시스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 티몬, 쿠팡 등도 비슷한 성장통을 겪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아직 안정적인 사업모델이라고 하기엔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사용자를 늘리는 데 초기 자원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콜센터로 사고담당자와 연결이 원활치 못한 것이나, 지정 공업사가 많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촘촘한 배차를 위해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도 운영을 해야 하지만, 저렴한 이용료를 내세우다 보니 열악한 주차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카셰어링 이용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로스트 앤 설리반(Frost & Sullivan)’은 2020년까지 전 세계 카셰어링 이용자가 2600만 명으로 늘어나 10조 원 시장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카셰어링 시장도 5년 내 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심 덕분에 국내 카셰어링 1위 업체 쏘카는 2014년 10월 베인캐피털로부터 18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1년 만에 운영차량을 1400대에서 3200대로, 회원수를 3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SK로부터 590억 원의 지분투자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카셰어링 사업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이지만,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먼저 이용자들의 뇌리에 자리 잡으면 ‘공유의 경제’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꽃피기도 전에 시들고 말 수도 있다.
우종국 자동차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