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면 한 번쯤은 다 당한다는 ‘사기․투자’피해...안전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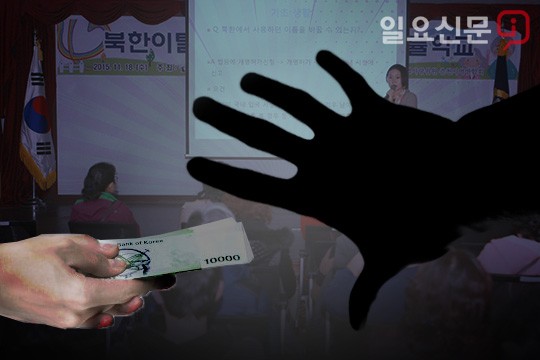
사기나 투자피해로 고통받는 탈북자들이 이 사회엔 너무 많다. 사진은 탈북자들의 법률 교육 장면. 연합뉴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11월 12일 늦은 밤 기자와 만난 30대 탈북자 A씨의 얼굴은 너무나 어두웠다. A씨는 2000년대 초 모친, 여동생과 함께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넘어왔다. 자녀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바라던 모친의 선택이었다. A씨 가족들은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A씨와 여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으며,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모친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A씨의 모친은 지난해 초 한 동료 탈북자 B씨로부터 식당 창업 제안을 받게 된다. B씨는 자신을 북한의 한 유명식당의 조리장 손녀라 소개했고, 고향에서 물려받은 비밀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리곤 자신을 믿고 식당사업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A씨의 모친은 B씨의 레시피를 철석같이 믿었고, 없는 형편에 덜컥 빚을 내어 수억 원을 넘게 투자했다. B씨의 제안대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인천에 2층짜리 북한음식 전문 대형식당을 함께 개업했다.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서빙 직원도 제법 많이 뽑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B씨의 레시피는 그저 말 뿐이었다. B씨의 음식은 도저히 상품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A씨의 모친과 투자자들은 부랴부랴 업종을 분식으로 바꿨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식당은 밀린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폐업했다. A씨의 모친과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말 그대로 증발해 버렸고, B씨는 홀연히 떠났다. 식당 자재들도 인테리어 복구비용을 대신해 건물주에게 모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남은 건 빚 뿐이었다.
A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B씨의 제안이 너무나 허술했지만, 환갑이 가까운 어머니는 남한 물정에 너무 어두웠다”라며 “어머니는 그 빚을 돌려막기 위해 우리 몰래 사채까지 썼고, 여동생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냈다. 나와 여동생은 배우자에게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원래 몸이 좋지 못하던 어머니는 지금 고령의 몸을 이끌고 지방에 내려가 가정관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수업료라 생각하기엔 A씨 가족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다.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인지도가 높은 탈북자 C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C씨는 늘 활동비 때문에 고민이 깊었다. 오랜기간 단체를 이끌고 있는 C씨는 그 인지도를 노린 주변의 사업 권유로 많은 출혈을 겪었다.
C씨는 몇 년 전, 장기간 요식업에 종사했다는 한 남한 사업가의 제안으로 본인은 물론 주변 탈북자들을 끌어 모아 서울시내에 식당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돈을 날렸다. 알고 보니, 문제의 점포는 이미 ‘이중 계약’이 된 상황이었고 사업가는 계약금을 챙겨 도망갔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C씨는 늘 자신 때문에 돈을 잃게 된 주변 탈북자들에게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맘이 무거웠다. 이를 간파한 지인이 C씨에게 한국의 각종 중고품을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C씨는 빚을 내가며 물건매입 대금을 지인에게 건넸지만 약속했던 수익금은커녕 투자금 회수조차 할 수 없었다.
C씨는 “지금도 내 탈북자 인맥을 활용하기 위한 이런저런 투자 제안이 들어온다”라며 “지금 보면 대부분 허상 같은 꺼리들이다. 일을 그르치고 나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 지금도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쉬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기자에게 수차례 걸쳐 사기 피해를 호소한 탈북자 출신 30대 가정주부 D씨의 사정도 참 딱했다. 비교적 최근 남한사회에 정착한 D씨는 교회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이웃으로 부터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제안 받았다.
1000만원만 투자하면 두 달 만에 투자금 회수는 물론500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이었다. 결국 D씨는 올 봄 두 차례에 걸쳐 그 이웃에게 1000만원을 건넸지만, 그는 종적을 감췄다. 알고 보니, D씨 주변 탈북자들도 비슷한 제안 속에서 사기를 당한 상태였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치고 다들 한 차례씩은 당한다는 전형적인 ‘폰지’였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허술한 투자 제안에 넘어가거나, 사기의 마수에 걸릴 때까지도 별다른 안전망이 없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그 후속 처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앞서의 A씨는 “물론 투자나 사기 위험에 대한 교육도 있고, 담당 형사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라며 “어머니가 일을 당한 후 하나재단에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익변호사의 형식적인 상담이 전부였다. 실무적인 도움이 거의 안됐다. 결국 최근 사비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파산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의 D씨는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 뿐이었다”라며 “없는 형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그렇고 절차나 형식도 잘 몰라 막막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 정착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금융제도도 다루고, 사기 및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선 엄격히 경고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피해가 발생하면 지역의 하나센터를 통해 공익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등 법률적인 도움을 주곤 있지만 상시적인 변호사 인력를 두거나 상담이 이뤄지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앞서의 A씨는 “일각에선 탈북자들의 전담 형사 인력을 통한 보호 강화를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탈북자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거부감이 꽤있다”라며 “그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의 법률 상담에서 벗어나 보다 상시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적 서포트와 교육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