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빼앗는데 정부는 ‘먼산 보기’

|
||
| ▲ 김태영 박사는 “오는 9월 4일은 중국이 ‘우리 땅’ 간도를 실효 지배한 지 100년째 되는 날로 국제법상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라며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촉구했다.-뉴시스 | ||
한 재야사학자의 피맺힌 절규로 ‘간도 되찾기 운동’의 열기가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다. 최근 불씨를 지핀 주인공은 이역만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재야사학자 김태영 박사(59). 그는 지난 1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간도반환 소송가능시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민들의 간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 선조들이 뿌리내리고 일궜던 땅 간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간도는 멀리 고구려·발해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우리 선조들이 개척하고 정착했던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 특히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 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무척 크다는 게 재야사학자들의 평가다. 조선시대에는 간도를 두고 청나라와 외교분쟁을 빚으면서까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으나 일제강점기 때인 1909년 9월 4일 일제가 남만주 철도부설권 등을 보장 받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협약(간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목할 것은 오는 9월 4일이 중국이 간도를 실효지배한 지 꼭 100년째가 되는 날이라는 사실이다. 김 박사는 “100년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라며 “이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한 나라가 어느 땅을 1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늦게라도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법률시효 기한인 100년을 넘기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간도협약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
그간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간도협약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줄곧 있어왔다. 협약무효화의 쟁점은 ‘국제법상 주권이 강탈된 상황에서 맺은 조약은 무효’이며 ‘우리나라를 배제시키고 일본이 주도한 간도협약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중·일 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합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한·일 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도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상 시효를 2주 남짓 남겨둔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간도 수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간도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게 간도 수복 운동을 펴는 시민단체들과 사학자들의 지적이다. 이쯤에서 간도를 둘러싼 과거사를 다시 한 번 짚어보자.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 넘겼다. 그리고 1909년 9월 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획정 지었다. 하지만 그간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논쟁은 △백두산정계비(1712년 조선 숙종 때 백두산에 세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의 가치 △비문 내용(토문강의 실체) △을유(1885년)·정해(1887년) 국경회담의 효력 △1885년 이후의 교섭사 및 ‘선후장정’(잦은 국경 분쟁 때문에 1904년 조선·청 관리들이 경계선을 두고 잠정 작성한 문서)에 대한 견해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조선은 백두산정계비를 인정하고 비문 속의 토문강을 송화강의 원류(해란강)로 봤으나 청은 정계비를 인정하지 않고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주장했다. 또 한·일은 19세기 말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무효로 간주했으나 청은 두만강 상류 200여 리만 미정일 뿐 나머지는 두만강으로 국경이 획정되었다고 주장, 논쟁이 이어져 왔다.

|
||
| ▲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어 북한 주민이 넘어올 것을 염두해 동북 3성 지역 단속에 들어갔다. | ||
그간 간도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 및 학자들은 일찌감치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해왔다. 간도문제가 백두산정계비를 조약으로 하는 국경분쟁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것은 정계비 건립과정에 나타난 국제법상 문제 때문이다. 조·청 두 나라는 문서로 국경을 합의한 적이 없다. 설사 정계비가 어느 정도 효력을 지닌다 할지라도 건립 당시 조선의 대표인 박권은 백두산 동행을 거부당했고 비문에도 조약체결 조선대표인 박권의 성명과 서명, 낙인이 없다. 또 당시 실질적인 조·청 국경선이 반영되지 않는 착오도 있었다. 정계비를 국제법상 국경조약으로 보기 힘든 근거다. 이처럼 간도 분쟁이 역사적으로 ‘진행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간도문제에 있어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왔다. 굴욕외교로 비난을 받았던 1992년 한·중 수교 때도 우리 정부는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넘어갔는가 하면 2004년 1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중국의 역사왜곡 행위를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자세를 취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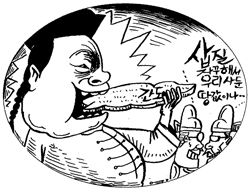
|
||
재야사학자들의 호소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여론 환기로 인해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간도협약무효결의안 지지서명까지 벌어지는 등 ‘우리 땅 간도 되찾기’에 뒤늦은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효문제를 제기한 김 박사가 작년 4월을 비롯해 올 6월에도 우리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에 100년 시효를 중단시키는 소송을 제기해 중국의 간도 영구 소유를 막아야 한다’는 탄원을 냈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4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로 국가만 소송을 낼 수 있기에 김 박사 개인이 나설 수 없어 모든 소송 자료를 준비해놓고도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물론 국가가 ‘간도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경제·안보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한·중·북 관계 등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국제사회의 협조 없이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려우며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로 볼 때 간도를 돌려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간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뒤늦게나마 정계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0명의 국회의원이 간도협약무효 결의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시한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간도 수복에 대한 강한 의지만 있다면 국제소송을 진행해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해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생긴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장희 교수 등 전문가들은 “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된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다”며 “따라서 이 협약은 원천무효이며 간도에 우리 민족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역사적 사실과 정황 등을 봐서도 우리나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0년 동안 지속된 중국의 간도 점유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방조가 중국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후면 간도를 되찾을 근거조차 사라진다”는 김 박사 등의 한 맺힌 절규가 더욱 안타까운 요즘이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