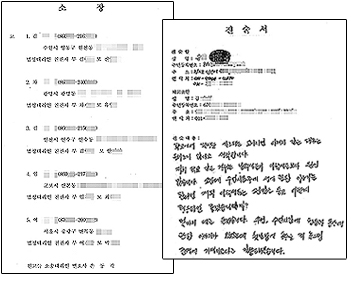
|
||
| ▲ 여학생과 학부모측이 작성한 소장(왼쪽)과 한 학생이 자필로 쓴 진술서. | ||
제자들의 송사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장본인은 이 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김아무개 교사(38). ‘원고’인 여학생들은 김 교사가 수업시간에 낯뜨거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성의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김 교사는 고의적인 성희롱은 전혀 없었다면서 여학생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학교재단측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재단측의 비리를 고발해 전임 이사장을 물러나게 할 정도로 학교와 갈등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다.
대체 어떻게 된 곡절일까. 먼저 여학생들이 제기한 ‘성희롱 위자료 청구 소송’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여학생들이 문제 삼은 김 교사의 발언은 크게 여섯 가지.
김 교사는 2003년 4월 학생들을 상대로 수능 기출 문학작품을 해설하던 중 ‘자지’라는 한자의 독음을 설명하기 위해 발음이 같은 한자 5개를 쓴 뒤, “직접 읽지는 못하겠으니 각자 읽어보라”고 지시했다.
여학생들은 이 대목에서 김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농담에 낯뜨거움을 느꼈다고 말한다. 특히 여학생들이 지적하는 것은 당시의 교실 분위기다. 당시 교실에는 남학생 20여 명, 여학생 6명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김 교사가 “각자 읽어보라”고 하자 남학생들이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키득거렸고 일부 남학생은 여학생들에게 야릇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한자음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예를 든 데다가 직접 독음을 읽은 것도 아닌데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내세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 거론된 것은 이른바 ‘청등 홍등’ 발언. 김 교사가 ‘청등’이라는 대목을 설명하면서 한 여학생에게 “넌 신혼 첫날 밤 청등을 켤 테냐, 홍등을 켤 테냐”라고 물어보고 여학생이 “홍등”이라고 대답하자 “넌 전생에 기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술집이나 차리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것.
또한 2003년 8월에는 김 교사가 가슴의 털이 보이는 옷을 입고 왔는데 한 남학생이 “진짜 털이냐”고 묻자 “발모제를 발라서 난 털이다. 너도 발라줄까”라고 대답했다는 것. 또 다른 반 수업에서는 여학생에게 “이 털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 너도 떼어줄까”라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교사는 ‘청등과 홍등’은 시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술집을 차리라’는 등의 말은 결코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가슴에 난 털을 발라줄까’라는 말은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수업을 듣던 한 남학생이 한 말을 갖다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고인 여학생들은 또한 2003년 9월 김 교사가 황진이 시조를 설명하며 “스님이 수십 년간 참았던 힘을 한꺼번에 뿜었으니 황진이가 얼마나 황홀했겠느냐. 뻑 가서 이런 시조를 지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사가 문학 작품 해설 도중 ‘현상’과 ‘본질’을 설명하면서 남학생들에게 “여자한테 못 믿을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알아”라고 질문한 뒤 남학생들에게 “화장발, 조명발, 성형발”이라는 대답을 듣고선 “그걸 확인하려면 혼전 섹스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남학생이 “찜질방에 가면 알 수 있지 않냐”고 하자 “그러면 이걸 확인할 수 없잖아”라며 여자 몸매를 상징하는 곡선을 손으로 그렸다는 것.
여학생들은 또한 2003년 10월 김 교사가 학생들에게 언청이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자가 임신했을 때 남자가 그렇게 찔러대거나 여자몸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이가 언청이가 되니 여자가 임신했을 땐 남자가 참아야 하고 정 하고 싶으면 약하게 패팅 정도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사는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뻑갔다’, ‘혼전 섹스’, ‘패팅’ 등의 용어를 써가며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자신의 업무분장 중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구성애식’ 적극적 성교육이라는 평소의 지론에 따라 한 말일 따름이었다는 것.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지도과정도 이수한 자신이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줄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난 1월31일 법원은 ‘피고(김 교사)는 개인당 1백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설사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수치심을 느꼈다면 김 교사의 수업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원고인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액수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김 교사의 성희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면서 “우리는 김 교사의 주장과 달리 재단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제를 일으킨 전임 이사장을 우리도 좋아하지 않는다. 학교가 어떻게든 정상화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 교사는 예상치 못한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을 받고 고민하던 끝에 지난 11일 “이의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사는 “다시 제자들과 기나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소송을 낸 제자들이 얼마 전 학교를 졸업한 상태고, 이번 소송 뒤에 일부 학부모의 불순한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흑백을 가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3년 11월 김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당시 이 학교 여학생 20명과 한 여교사가 각각 수업중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건으로 김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었다.
당시 여고생들이 제기한 성희롱 고소 건은 최근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거론된 내용과 거의 흡사했다. 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것. 그러나 검찰은 이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업시간 중에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인 만큼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성희롱 수업’ 고소에 대해 형사적 ‘면죄부’가 내려지자 애초 고소인 중 다섯 명이 다시 김 교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금에 이르게 된 셈이다.
여교사가 고소한 성추행 건은 술자리에서 김 교사가 자신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키스를 강요했다는 내용. 그러나 김 교사는 관련 재판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았고 지난 1월27일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김 교사는 당시 성추행의 증인으로 나선 교직원들이 물러난 전임 이사장의 친형과 8촌동생인 점으로 보아 재단측의 보복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3명은 김 교사가 성추행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스승과 제자 간에 보기 드문 송사가 벌어지고 있는 D고교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표방하며 지난 2002년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듬해 재단이사장의 횡령과 부실 운영으로 말미암아 국정감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D고교는 교육청에 의해 이사장이 파면 및 고발되고 행정실장이 파면되는 홍역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김 교사가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에게 학교의 비리를 내부 고발해 주위에 양심적인 교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간 김 교사는 자신이 재단비리를 고발한 것 때문에 재단측이 개입해 보복성 송사를 계속 진행해온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여학생들은 학교 비리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김 교사의 언행이 문제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A양(18)에 따르면 2003년 5월 여학생들이 방과 후 기숙사에 모여서 당시 첫 부임한 김 교사의 수업방식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 끝에 여학생 대표가 문제 발언들에 대해 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김 교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송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형사 고소 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은 김 교사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민사 소송에선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 됐다. 물론 김 교사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임을 밝혀 사제지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조만간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연 김 교사는 일부 여학생들의 지적처럼 ‘문제 선생’인가, 아니면 그 자신의 주장처럼 ‘억울한 희생양’인가. 그 판단은 다시 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