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사업 넘겨주고 ‘돈맥’ ‘인맥’ 챙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대산앤컴퍼니는 130억 원의 예수금을 납입하고, 에이앤에프팻을 인수하기로 사조그룹과 합의했다. 사조그룹 측은 “우발채무 등이 발견되지 않아 인수금액을 13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에이앤에프팻은 6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연간 27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특히 에이앤에프팻의 자본금은 153억 원에 달하는 반면 부채는 10억 원에 불과해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시장 일각에선 ‘에이앤에프팻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사조 측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정상적인 기업 평가를 거쳤고, 당시 환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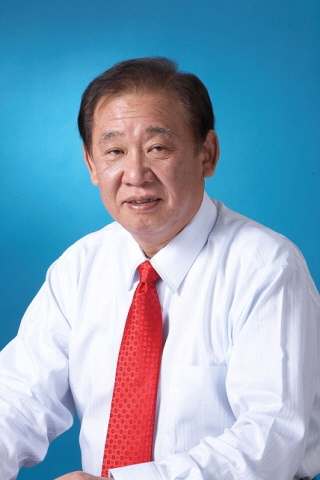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사진제공= 사조그룹
앞서 동아원그룹이 사조그룹에 매각됐을 당시 시장에선 주진우 회장이 경기고 동문인 이 전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를 잠시 맡아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사조 측은 이를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조가 이 전 회장에게 에이앤에프팻을 재매각하면서 주 회장이 이 전 회장의 ‘흑기사’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조 측은 “이 전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를 정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동물사료 판매 회사인 대산앤컴퍼니의 주된 매출처가 에이앤에프팻이고, 우리로선 미국 애완동물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이유가 없어 이 전 회장 측에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월 동아원 인수전 당시 투자(IB)업계는 동아원의 매각가로 3000억 원을 예상했다. 국내 제분업계를 삼분하고 있는 한국제분을 모태로 둔 동아원은 사료·와인 사업 등에서 큰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내 제분업계는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수십 년째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연간 5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과 2000억 원에 달하는 자산도 매각가 산정에 반영됐다.
그러나 실제 매각가는 160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예비 입찰에 참여한 잠재 인수 후보들은 물론 매각주간사도 예상 못한 ‘깜짝 딜’이었다. 동아원 매각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국제분 지분 등을 팔아넘겼다. 인수 방식이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매입이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실제 거둔 수입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추징 압박을 받던 이 전 회장으로서는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격이었다. 차임금 등 동아원이 갚아야 할 금융비용이 6000억 원에 달해 자칫 매각이 무산되면 이 전 회장이 남은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희상 전 동아원그룹 회장. 사진출처=한국제분협회 캡처
그러나 주 회장의 동아원 인수 배경에 ‘인맥’이 있었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로 2015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75억 원을 대납한 바 있다. 앞서 주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사조해표(옛 신동방)를 인수하면서 정계와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었다. 어릴 적 대통령이 꿈이었다던 주 회장은 본인이 직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 지역구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와인을 사실상 독점 납품하는 등 이명박 정부 인사와도 친분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배용준, 박세리 등 유명 인사와도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정계 인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주 회장으로서 이 전 회장과 거래가 나쁠 것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은 에이앤에프팻 인수에 이어 자신이 애착을 가졌던 와인회사 ‘코도’를 되찾기 위해 사조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조 측은 “이 전 회장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초부터 투자은행(IB)업계에서 코도의 매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조 측은 그러나 한국제분에 대해선 “매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주 회장의 아들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는 한국제분의 지분 9.88%를 취득했다. 과거 동아원과 거래 관계에 있던 재계 관계자는 “주 회장이 어려울 때 이 전 회장을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핵심 사업을 다시 넘겨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