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예술의 고향은 자연이다. 자연의 메시지를 감성으로 풀어낸 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자연을 향한 뛰어난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센서는 언제나 풍부한 감성으로 충전돼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장종균은 예민한 센서를 가진 작가다. 그는 풍경을 그린다. 캔버스에 유화로 그렸고, 꼼꼼하게 살펴볼 만한 특별한 기법도 없다. 이런 기법의 그림을 요즘 정서에서 보면 흘러간 유행가 같다. 공영 방송에서 구색 맞춰 편성한 가요무대를 보는 느낌이다. 그런데도 그의 그림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왜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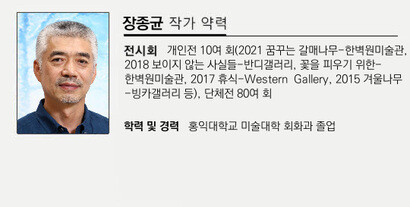
장종균 회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상은 나무다. 멋들어진 풍채를 자랑하는 우람한 나무가 아니고, 뒤틀리고 골곡 많은 앙상한 가지의 볼품없는 나무다. 거의 나목에 가까운 애처로운 몰골의 겨울나무다.
사연 많은 사람의 일상사처럼 무수하게 많은 잔가지를 장종균은 섬세하게 그려낸다. 이처럼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나무를 가지고 예사롭지 않은 정취를 빚어낸다. 순수 회화 언어인 색채의 조합과 물감의 두께만으로. 그래서 그의 나무 그림에서는 진한 여운이 배어나오는 것이다. 마치 저녁 산사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처럼.

‘겨울이 되면 나무는 온몸으로 추위와 맞선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가지를 마구 흔들어댈 때면 나무는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자신의 몸에 흐르던 생명의 기운을 거두어들인다. 뿌리를 땅 속으로 더욱 깊이 내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깊은 휴식에 들어간다. 겨울을 보내는 나무가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과정의 모습이다.’
고난의 시절을 견디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장종균의 겨울나무 같아 그의 그림이 더욱 살갑게 다가온다.
전준엽 화가
| 비즈한국 아트에디터인 전준엽은 개인전 33회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400여 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학원>, <일요신문>, <문화일보> 기자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했다. <화가의 숨은 그림 읽기> 등 저서 4권을 출간했다. |
전준엽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