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하 부산지방병무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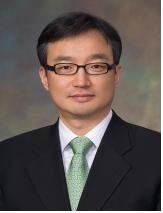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지배 계급인 양반과 피지배 계급인 상민 및 천민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상민은 농공상(農工商)에 해당되는 계층의 사람들로서 병역 의무가 있었으나 천민은 병역에서 제외됐다. 왕실가인 종친과 양반도 원칙적으로는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소위 ‘꽃보직’이라 할 수 있는 ‘충의위(忠義衛)’에 속했다.
물론 군적에 속했다고 모두 병으로 입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접 군인이 되어 병역의 의무를 치르는 이를 정군(正軍)이라 했고, 징발자들을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해야 하는 부류를 보인(保人)이라 했다. 요컨대 정부가 병역을 담당해내는 정군(병사)의 월급을 주지 않고, 병역 담당자들의 상호 부조에 의존했던 것이다.
병역면제의 기준은 물론 당시에도 있었다. 지체장애인과 현직 관료, 그리고 학생(성균관 유생, 사학 유생, 향교생도)과 2품 이상의 전직 관료 등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한 명,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는 아들 모두를 면제시키는 등의 규정도 있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의 자손은 3대까지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았다. 도첩(승려자격증)을 받은 스님(僧)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는 천민의 경우 병역을 원천적으로 면제 받았다. 하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신분계층인 천민이 양인으로 승격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양인이 되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병역의 의무였다. 이 병역의 고달픔 때문에 스스로 천민으로 다시 떨어지기를 자처한 딱한 케이스도 있었다.
1473년(성종 4년)의 일이다. 손장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원래 천민이었다가 세조 시절 ‘이시애의 난’(1467년) 때 진압군에 자원 종군한 공로로 양인이 됐다. 감격스런 신분상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장수는 “환천(還踐), 즉 다시 천민이 되겠다”는 애절한 사연을 담은 소장을 병조에 제출했다. “너무 가난하고, 미약해서 병역을 감당하기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발 성균관의 노비로 살게 해주십시오.” 딱한 사연을 들은 성종 임금은 “그러라”고 윤허했다. 얼마나 병역이 괴로웠으면 차라리 노비의 신분이 낫다고 했을까.
조선후기 신분제의 혼란으로 상민에서 양반으로의 상승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군역을 감당할 상민의 수가 줄어들자 이들에게 부과되는 군포 등의 부담이 급증하여 황구첨정(黃口簽丁)이니 백골징포(白骨徵布)니 하는 부정부패의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군역 등 삼정의 문란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결국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병역, 즉 군역(軍役)은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난 이 땅 남자들의 ‘벗어날 수 없는 짐’인 것은 틀림없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병역의 고통’은 조선시대 사람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16살부터 60살까지 지긋지긋하게 병역의 의무를 견뎌내야 했던 조선시대와 21~24개월간만 ‘쿨’하게 버티고 예비군훈련 몇 년, 민방위훈련 몇 년 받는 요즘과는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군대생활은 1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고달픈 시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균등하면 가난하지 않고, 화합하면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으며, 편안하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다’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국내·외적으로 큰 위협이 밀려오고 있는 요즘 시기에 공정한 병역의무부과와 이행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오늘도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에 대기 중인 병역의무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다. 이들에게서 이 나라의 앞날에 커다란 희망을 보게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국민행복을 위한 병무행정의 수행을 전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임재하 부산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