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주도했던 전직 경찰 증인 출석...다른 고문 사건 피해자도 증언
7월 18일 부산고등법원 301호 대법정(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세 번째 심문기일에 참석한 장동익, 최인철 씨의 표정이 굳었다. 법정 밖에서 한 남자를 본 뒤부터다. 장 씨와 최 씨는 이날 남자와 마주치기 직전까지도 그가 법정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남자는 전직 경찰관(이하 A 씨)이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 핵심이 될 증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1991년 11월 8일, 낙동강변 2인조를 직접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다음날 이들을 구속했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수사 전반을 주도했다. 당시 작성된 경찰 조서 등 수사기록을 보면 이 남자의 이름과 서명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장 씨와 최 씨는 고문과 폭행도 이 남자의 손끝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도 A 씨의 증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당시 경찰관의 고문과 폭행이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냈지만, 법원의 공정한 판단 없이 과거사위 결과만으로 재심 개시가 결정되면 3심제 형사소송법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A 씨의 증언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을 풀 열쇠였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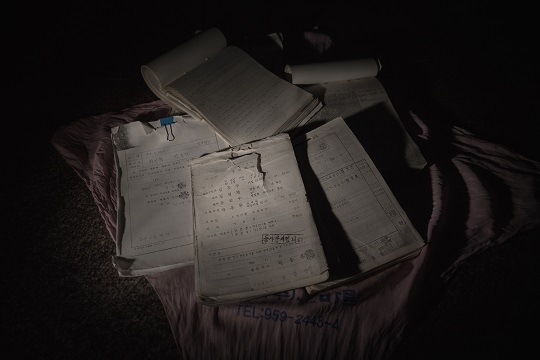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세 번째 심리가 열렸다. 사진=진실탐사그룹 셜록 제공
# “나는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했다”
“최인철 씨를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박준영 변호사)
“당시 부산 사하구 을숙도 유원지에서 경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함께 신고된 차량 번호를 토대로 최인철 씨를 특정했고, 양식장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최 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A 씨)
증인석에 앉은 A 씨는 낙동강변 사건의 시작부터 구체적으로 기억했다. 그는 최 씨를 ‘검거’하기 직전 그의 부인을 만나 나눴던 대화부터 경찰 복무규정과 당시 사건에 적용한 법리를 지체 없이 설명했다. 자신이 근무했던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의 구조도, 소속 팀원 8명이 2인 1조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했던 일도, 낙동강변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의 이름도 금방 떠올렸다.
지난 6월 두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현직 경찰관의 증언을 직접 뒤집기도 했다. 현직 경찰관은 사건 수사 당시 자신은 막내경찰이라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 보고서와 조서 등에 적힌 본인의 이름과 서명은 자신도 모르게 선배들이 임의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18] 법정 선 당시 수사 경찰,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A 씨는 “그(현직 경찰관)와 함께 수사를 했고, 기록에 남은 모든 서명과 날인은 당시 조사를 벌였던 담당자가 직접 남겼다”고 증언했다. 둘 중 하나는 자칫 ‘위증’을 의심받을 수 있는 답변이었지만 A 씨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A 씨는 유독 고문과 폭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태도가 달라졌다. 앞선 질문들에 전후 사정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설명했던 것과 달리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관련해선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고문이 일어났던 장소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사건이 방대했던 만큼 당시 팀장이 조원들에게 업무를 나눠줬다”며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최 씨와 장 씨를 조사하면서 범죄 경력을 조회해 봤는데 깨끗했다. 당시 전과자도 아니고 무엇보다 자백을 했던 만큼 수사 과정 내내 그들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이어 재판부도 “고문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달라”고 재차 물었지만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 “거꾸로 매달아 놓고 탕수육 시켜 먹었다”
이날 재판에는 A 씨에 앞서 낙동강변 2인조가 검거되기 2달 전,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남성(이하 B 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이 남성의 사례는 지난 2017년 6월 박 변호사의 재심 청구 준비 및 ‘일요신문’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1946년 설립된 ‘부산일보’ 사옥에 직접 방문해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 치 신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관련기사-[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9] 그때 부산 경찰 고문‧폭행 더 있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3년 간 부산에서 총 33건의 경찰의 가혹행위 사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낙동강변 2인조가 구속된 1991년부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1992년까지 2년 사이엔 총 15건의 경찰의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B 씨는 이 시기에 경찰에 검거돼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전,후에 경찰의 고문, 폭행, 사건조작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출처=부산일보 데이터베이스
B 씨 사건은 1992년 8월 4일자 ‘부산일보’에 실렸다. 보도 내용을 보면, 그는 1991년 9월 대구원정소매치기단 공범으로 지목됐다. 당시 부산 사하경찰서는 물고문과 폭행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검찰에 넘겼다. 1심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B 씨는 당시 ‘피해자’가 고령으로 숨지기 직전 “B 씨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B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경찰의 고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것조차도 힘들어 증언도 하지 않으려 했다”며 입을 열기 시작한 그는 “당시 경찰이 쪼그려 앉은 다리 사이에 쇠파이프를 꽂고 거꾸로 매달았다. 수건을 얼굴에 덮은 뒤 코에 겨자가 섞인 물을 부으면서 혐의를 인정하면 손가락을 ‘까딱’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B 씨가 증언한 경찰의 가혹행위 수법과 장소는 낙동강변 2인조가 주장한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 당시 B 씨에 대한 고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형사과장은 낙동강변 사건을 지휘했던 형사과장과 같은 인물이다. B 씨와 낙동강변 2인조는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이번 재판에서 마주치기 전까지 한 차례도 접촉한 적이 없다. B 씨의 소재는 최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동안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던 이들이 비슷한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B 씨는 증언 과정에서 중국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고문 받을 당시 경찰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웃옷을 벗은 채로 탕수육과 짜장면 등 중국음식을 시켜 먹었다”며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워서 지금까지도 중식은 먹지 못한다”고 말했다. 낙동강변 2인조 최인철 씨도 겨자 섞인 물고문을 받은 이후 최근까지도 겨자를 먹지 못한다.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관 가운데 아직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찰관은 총 2명으로 줄었다. 고문 지시 의혹을 받는 앞서의 당시 형사과장과 팀장이다. 형사과장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소재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해왔으나 재판부는 가능하면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