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증거” vs 변호인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피해자가 신체 주요 특징 등 상세히 설명하면 수사 흐름 좌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김학의 팬티’ ‘김학의 속옷’ 등이 검색어에 등장하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실 성범죄 때 자주 활용하는 수사 방법 중 하나다. 속옷 등은 성범죄 상황을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 종종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확인하는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는 게 성범죄 수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6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속옷’으로 입증 시도
지난 7월 5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혐의를 부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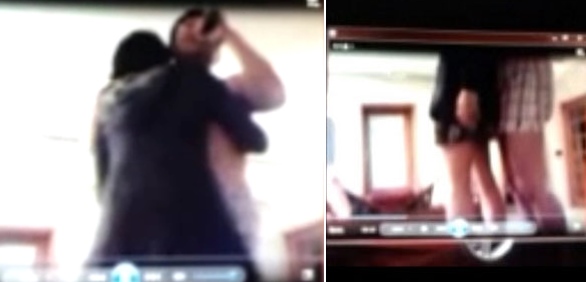
사진=KBS 뉴스 캡처.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 사실 정리와 변호사 측의 대략적인 입장, 향후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정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김 전 차관 사건에서의 검찰은 달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찍었다는 김 전 차관의 팬티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이 내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에 대한 반박 증거인 ‘팬티’를 재판 시작 전부터 쟁점화한 것이다.
검찰이 이런 사진까지 낸 데는 이유가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아무개 씨로부터 성접대와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해야 할 단계가 2가지인 것.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사이 윤 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13차례의 성접대도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액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사각팬티만 입고 여성을 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동영상에 나오는 팬티 형태와 비슷한 팬티들을 김 전 차관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해 사진을 찍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이다.
실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별장 성관계 동영상 속에서 해당 남성은 사각팬티만 입은 채 여성을 껴안고 블루스를 추며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맺는데, 해당 영상 속 남성 속옷과 김 전 차관이 현재 착용하는 속옷이 유사하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이 해당 영상 속 남성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검찰은 재판부에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일정한 성향을 지니는 만큼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검찰 입장에서는 성관계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팬티를 증거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당연히 김 전 차관 측은 반발했다. 변호인은 즉각 재판부에 “그 사진(속옷)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으니 증거로 제출하는 게 맞지 않다”며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의 증거 채택 여부를 곧바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제시한 팬티 사진은 특이한 무늬나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삼각이냐 사각이냐의 차이 정도”라며 유사한 팬티라는 게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임준선 기자.
법조계에서는 ‘팬티’보다는 검찰의 ‘의지’를 봐야 한다고 풀이한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속옷 취향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며 “그것보다는 공판준비기일 때 김 전 차관 속옷 취향과 동영상 속 남성 속옷까지 분석하며 촘촘하게 수사를 한 검찰의 의지를 봐야 한다, 향후 재판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김 전 차관이 해당 영상 속 남성임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역임한 판사 출신 법조인 역시 “40~50대 남성 중 박스 형태의 속옷을 입는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은 흔히 쓰는 수사 기법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심지어 이보다 더한 수사도 이뤄진다고 한다. 속옷 색깔과 형태 등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신체 은밀한 부위에 대한 묘사로, 성범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13년에는 동성커플 관계의 한 남성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에이즈’를 옮았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남성 A 씨는 동성인 B 씨와 10개월 동안 사귀면서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도 가졌는데, 그 후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B 씨로부터 옮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에이즈 보유자인 B 씨는 “연애는 했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이에 검찰은 A 씨로부터 신체 중요 부위 특징을 묘사하게 한 뒤 B 씨의 신체를 확인해 이를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B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법원에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B 씨의 옷을 강제로 탈의시킨 뒤 A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B 씨를 기소할 수 있었다.
성범죄 수사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강제적인 성관계 등은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강제성 입증이나 실질적인 성관계가 실제 있었는지 입증이 ‘진술’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가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지, 또 피의자의 신체 주요 부위 특징이나 당시 착용 속옷 등을 피해자가 얼마나 상세하게 묘사하는지에 따라 수사 흐름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