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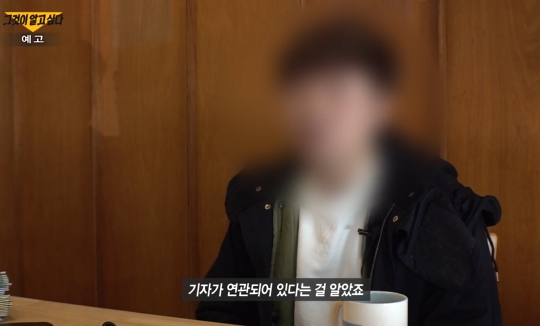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7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94회는 ‘가짜 펜을 든 사람들, 누가 사이비 기자를 만드는가’ 편으로 꾸며진다.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연락을 해온 건 경북 영천에 위치한 한 공장의 주인 이 아무개 씨. 그는 자신의 공장에 폐기물 불법 투기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진에 다급한 연락을 보내왔다.
이 씨는 지난 2월 ‘자재를 보관할 것이니 공장을 임대 해달라’며 한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고 그 남자는 임대 두 달 만에 자신의 공장을 온갖 폐기물로 뒤덮고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제작진이 확인한 공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이 씨의 공장에 쌓인 폐기물은 약 7000톤으로 처리 비용만 18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씨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임차인. 피해자 측은 임차인은 그저 바지사장일 뿐 그 뒤엔 폐기물 불법 투기 조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취재를 이어가던 제작진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인물을 발견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한 남자의 이름으로 된 ‘환경 기자’ 명함이 발견된 것. ‘환경 기자’와 불법 폐기물 투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는 왜 폐기물 불법 투기의 브로커로 지목된 걸까.
그를 추적하던 제작진은 실제로 그가 ‘취재 부장 기자’로 등록된 신문사를 발견했다.
취재를 이어가던 제작진은 과거 한 일간지 스포츠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제보자는 자신이 일했던 곳은 ‘좋은 언론의 기능을 하기 위해 존재하던 곳이 아니었다’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인터뷰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뭔가 말을 입력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말도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사는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쓰는 거지 사람이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기사를 작성하는 곳이지만 키보드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사무실. 복사, 붙여넣기로 작성했다는 기사.
한 사람이 하루에 130건 넘게 기사를 작성했다는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이며 제보자가 말하는 현 국내 언론의 실태는 어떤 모습인 걸까.
제작진은 기사 보도를 대행해준다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6건에 120만 원, 15건에 270만 원 등 기사는 상품처럼 팔리고 있었다.
국내 언론매체 약 2만여 개. 간단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언론사’, 그리고 그보다 더 쉽게 될 수 있는 ‘기자’.
이토록 많은 숫자의 언론사와 기자들은 모두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지 살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