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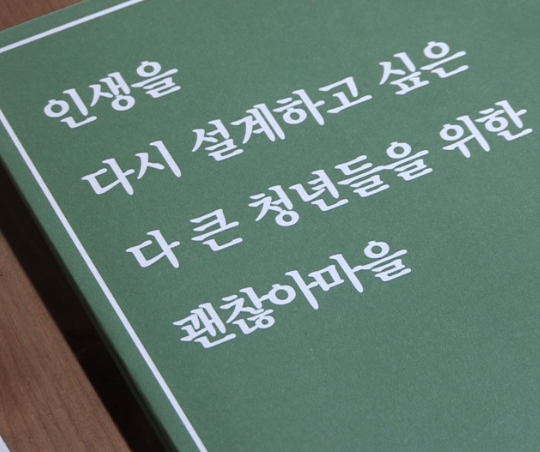
출처=KBS 다큐 3일
출퇴근 길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시대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도시 생활. ‘잘’살아가고 싶은 청년들 앞엔 굴곡지고 험난한 언덕이 너무나 많다.
청년들의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보다 자살이 앞지른 지 오래지만(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 그래도 이겨내라고, 깨치고 일어나라는 사회의 채찍질은 여전하다.
힘들고 아픈데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와’라고 말해주는 고향이 없어서 직접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도심을 떠난 청년들이 있다.
그들의 새로운 둥지는 바로 목포의 괜찮아마을.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이 마을의 이야기를 3일 동안 기록했다.
다도해와 유달산이 감싼 전남 목포시 무안동 일대 한국의 네 번째 개항 도시로서 화려했던 이곳은 현재는 원도심이라 불리며 과거의 흔적만 가득하다.
공실률 70%에 달할 정도로 빈집만 무성하던 이곳에 최근 20~30대 청년 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이 하나둘 모이게 된 건 3년 전 홍동우, 박명호 씨가 괜찮아지길 원하는 청년들의 욕구를 절감하며 ‘목포에서 6주간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기획한 후부터였다.
2018년 8월부터 작년 겨울까지 총 3기수 76명의 청년이 목포에서 지냈다. 이들은 쉬기도 하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작게나마 성공해보며 괜찮아지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6주 프로젝트가 끝난 현재 목포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택한 30여 명이 남아 이곳의 주민이 되었다. 한 달 살기도, 도시 재생 프로젝트 때문도 아닌 그저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써 목포를 선택한 청년들.
이들은 여느 마을의 주민들처럼 각자 생업을 갖고 역량껏 집을 구해서 하루를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청년들은 본래 삶의 터전이던 곳을 떠나 아무 연고도 없는 목포에 정착했다. 이들을 모이게 한 마법의 주문은 단 하나 ‘괜찮아’.
똑같은 일상생활과 불필요한 관계를 떠나 자신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도 되는 삶을 찾아온 것이다.
각지에서 온 만큼 직업도 다양하다. 디자이너, 마케터, 요리사 등,청년들은 각자의 경험을 크레파스 삼아 흰 도화지 같은 목포 원도심을 다채롭게 채우고 있다.
덕분에 임대 종이만 펄럭이던 빈집들은 북적북적한 식당이 되고 게스트하우스가 되고 영상 스튜디오가 되었다.
평소 다양성에 관심이 많던 윤숙현 씨는 요식업 경험을 바탕으로 채식 식당을 차렸다. 이탈리아 유학 출신 셰프인 한상천 씨는 누구나 먹는 보통의 음식을 요리하고 싶어 백반집을 개업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김용호 씨는 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바를 꾸렸다. 모두 도시에선 높은 월세와 경쟁률로 상상만 했던 것들이었다.
창업뿐만이 아니다. ‘괜찮아마을’을 만든 여행사 겸 콘텐츠 기획사에는 열두 명의 식구들이 있다.
2017년 대표 두 명으로 시작한 이 회사에는 목포 정착을 결심한 청년들이 취업했고 이제는 공개 채용도 할 만큼 목포에 뿌리를 내렸다. 마케팅을 비롯해 디자인, 행정, 기획 및 출판 등 도시에서 쌓은 각자의 경력은 회사의 분업화를 이뤘다.
서로를 직함 대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사내에는 밴드를 비롯한 각종 소모임도 있다. 덕분에 이 회사에는 벗어나고 싶은 직장 문화 대신 같이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하다.
그 누구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 집을 구해야 했다. 그래서 겉보기엔 도시의 생활과 다를 바 없이 바쁘고 치열하며 심지어는 스트레스까지 여전하다.
그런데도 지방 살이를 계속한 힘에 대해 청년들은 한 입 모아 ‘서로’라고 말한다. ‘나 같은 사람도 잘살 수 있는 곳’을 꿈꾸며 모인 이들은 삶을 바라보는 고민의 방향과 깊이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
그 때문에 도시에서 감추기 급급했던 남과 다른 생각은 이곳에선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고 마음껏 상상하고 저지른 일들은 무엇이든 만들어냈다. 등을 떠밀어주고 응원하는 서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괜찮아마을’의 1기 6주 생활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기록한 후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김송미 씨는 서울 생활에 지칠 때마다 이곳을 찾았다.
아직 서울과 목포의 삶 중 그 어느 것에도 정답을 찾진 못했지만 우선 자신에게 방학을 주는 의미로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한 곳. ‘괜찮아마을’은 어느새 기댈 곳 없는 이들의 고향이 되었다. 자신의 정답을 당장 실험해보고 지금의 행복을 미루지 않는 것. 이 마을의 동력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