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전두환의 내란죄를 심판하는 법정을 하루 8시간씩 30일을 다 보고 기록했다. 진압군이 무너진 것은 중령 한 사람과 대위 두 명에 의해 진압군 지휘부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그 상황을 요약하면 대충 이렇다.
군사 반란이 있던 그날 밤 11시 30분경이었다. 반란군에 가담한 조 대령이 진압군의 신 중령에게 전화를 했다.
“그곳 지휘부에 있는 사령관과 장군들을 모두 체포해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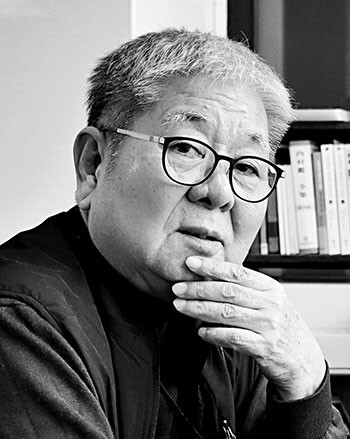
진압군의 지휘본부 주변에는 수십 명의 병력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자칫하면 사령부 내에서 총격전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는 기지를 발휘했다. 지휘부 경비를 서는 책임 장교에게 임무 교대를 명령받았다고 했다. 새벽 3시경 그는 병력 60명을 동원해 진압군의 지휘본부로 갔다. 경비하고 있던 병력은 그들이 교대하러 온 것으로 알고 막사로 돌아갔다. 그는 인솔해 간 병력을 지휘부 주변에 배치했다.
그는 대위 두 명 하사관 두 명을 데리고 장군들이 모여 있는 사령관실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장군들의 부관 및 보좌관 20명가량이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충돌 위험이 있었다. 신 중령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모두 옆방에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감금해 버렸다. 하사관에게 그들을 감시하게 하고 그는 대위 두 명과 함께 총을 들고 장군들이 있는 방문을 차고 들어가면서 “손들어”라고 소리쳤다. 장군들이 순간 멈칫했다. 권총에 손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벽에 대고 위협사격을 가했다.
“신 중령 총 쏘지 마라.”
장군들 사이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집단 항복의 뜻이었다. 그는 사령관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던 진압군 장군들을 모두 체포해서 반란군 쪽으로 넘겼다. 진압군이 패배하고 전두환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반란은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목숨을 건 순간적인 행위다.
그로부터 45년이 흐른 2024년 12월 3일 무장병력 수백 명이 국회로 난입했다.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등 핵심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다.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일선 행동대장인 중령이나 대위들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위협사격도 없었다.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있자 그들은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방향을 돌렸다.
분노한 시민들이 군인들의 길을 막아서자 제발 돌아가게 해달라고 사정까지 하는 모습이었다. 특전사령관이나 계엄사령관은 국회에 나와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은 군과는 달리 국정원 차장에게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명령했다. 국정원은 그 명령을 거부했다. 한 원로 언론인은 군복무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라는 병정놀이를 한 것 같다고 했다. 반란을 일으키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데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목숨을 걸고 명령을 수행하는 45년 전 군사 반란 때의 신 중령이 존재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광주항쟁의 후유증이 군인들의 의식에 각인된 것 같다. 더 이상 그들은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이 사형선고를 받고 사면은 됐지만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한 사실을 안다. 동원된 군인들도 평생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안다. 내란은 성공하기 힘들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