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모시고 대형병원 응급실로 갔다. 응급실은 철옹성이었다. 아예 어머니 같은 환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사 한 명이 문 앞을 막고 있었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수문장이었다. 사정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응급실 문 앞 바닥에 어머니를 눕히고 망연해졌다. 나는 의사인 친구들을 통해 부탁해 보았다. 소용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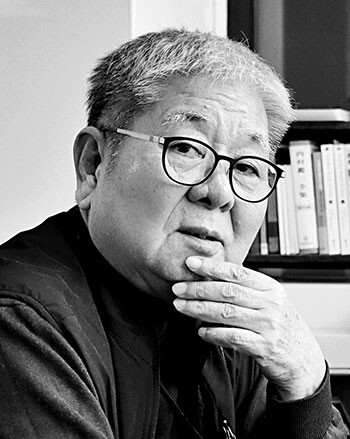
속으로 은은한 분노가 일었다. 만약 내가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렸던 시절 보았던 흑백영화 장면에는 돈이 없어 의사 얼굴 한번 못보고 의원 앞에서 한을 품고 죽어가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다. 노의사들은 그 당시 왕진을 와서 청진기를 대고 주사 한번 놓는 가격이 쌀 한 가마니 값이었다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그 시절 북한의 김일성은 인민 누구라도 국가가 건강을 돌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평양에 국제적인 산부인과 병원을 만들어 임산부는 무료로 모든 의료혜택을 받게 했다. 그 무렵 박정희 대통령과 신현확 보사부 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을 주도했다. 그것은 첨예한 체제경쟁의 문제이기도 했다.
그 무렵 우리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따르던 미국의 의료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미국은 의료에 있어서도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가까웠다.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으라는 식이었다. 병원에 입원하면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나왔다. 자본주의에서 의사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지도 모른다.
사회주의적 의료 시스템을 택한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응급환자가 가도 의사를 보기 힘들다고 했다. 진료신청을 하면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는 의사는 환자보다 자신의 휴식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당시 북한과 의료체제 경쟁을 하게 된 신현확 보사부 장관이 해외를 시찰하고 제도를 연구해서 이룩한 혁명적인 시스템이 지금의 의료보험제도였다. 그때부터 국민들은 아플 때 싼 가격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치부를 하는 걸 막는 것이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들이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의사협회장이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사들의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를 열 배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에서 30등이 의사가 되어야 하겠느냐는 글도 봤다.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는 특례법을 만들라고 한다. 더 이상 현 정부를 정부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격한 의사협회의 성명이 나왔다는 기사도 봤다.
의사들이 강경 투쟁을 하며 요구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 산모가 진통을 해도 아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 어린아이가 아파도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기 힘들다. 외과 의사도 내과 의사도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지방의 병원은 더 의사가 부족하다. 부족하면 의사를 늘려야 하는 정책이 맞는 것 아닌가. 그에 따르는 교육 설비는 부차적인 것이다.
의사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피부나 성형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쪽에 돈이 몰려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의사 사회에서 그들끼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의사는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업군이다.
위급한 환자의 생명이나 국민건강을 인질로 삼은 의사 집단에게 정부의 의사증원정책은 매번 패배해 왔던 것 같다. 분출하는 의사단체의 과격한 의사표시는 소수 강경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의사 숫자를 절대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본질은 무엇일까. 그 진심을 묻고 싶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