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 40대 초쯤 됐을 때 처음으로 허허벌판이던 목동에 작은 집 하나를 지었어요. 거기서 지금까지 50년을 살고 있어요. 이사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집에서 중풍인 아내를 19년 간병을 했는데 몇 년 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죠. 이제 좁은 잔디밭도 잡초가 무성해요.”
나는 그 말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를 사장으로 모시려고 하는 방산업체도 있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혹도 있었다. 그는 모두 거절했다. 그렇게 스스로 만든 가난을 청빈이라고 한다. 나는 청빈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는 혼자 사는 노인인 그에게 어떻게 먹고 사는지 물었다.
“아침 겸 점심으로 누룽지를 끓여 먹어요. 낮에는 걷죠. 그리고 저녁에는 고구마를 하나 정도 먹는데 그 정도로 충분해요.”
소박한 식사다. 그는 나의 집을 오는데도 오래된 난방셔츠와 바지 외에 속옷 한 벌 칫솔이 전부인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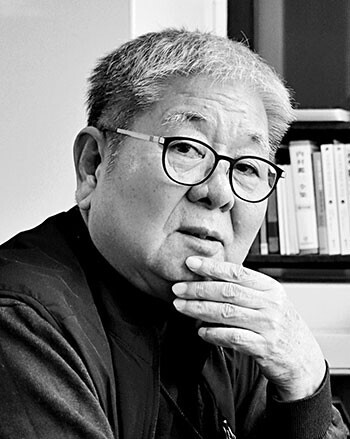
개발 시대 이사만 몇 번해도 부를 늘릴 수 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 일생 문학을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 결심을 한 게 있다고 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했다는 것이다. 쌀 한 줌에 김치 그리고 연탄 2~3장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습관을 평생 유지했다. 나는 그에게서 청빈을 보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친구가 있다. 중학교 때부터 나와 우정을 유지해 오고 있다. 장관직을 마친 후 그 친구가 내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내무부 장관 출신들 모임에 갔었어. 어떤 사람은 장관을 그만둔 지 10~20년이 넘었는데도 비서에 기사를 두고 부인이나 자식들도 풍족하게 돈을 쓰고 사는 거야. 공무원 이외에는 한 게 없는 데 말이야. 솔직히 뇌물을 많이 먹어뒀다는 소리지. 얼마 전에 내가 붐비는 지하철에서 데리고 있던 공무원을 만났어. 그가 나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장관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나? 하는 눈빛이더라고.”
그 친구도 청렴하다. 나와 재래시장의 허름한 가게에서 국수를 사먹기도 하고 노점에서 파는 호떡을 즐긴다.
노태우 대통령 딸인 노소영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에게 재산분할금액으로 1조 3808억 원을 그리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보도를 봤다. 법원은 노태우 대통령이 재벌가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어제 오후 몇 명의 법조 원로들과 점심을 먹을 때였다. 오랜 세월 법관을 지낸 분이 이런 말을 했다.
“법원이 장물도 재산분할을 해 주나. 대통령이 뇌물로 먹은 돈들을 그 딸에게 주라니.”
모임에 나온 원로 법조인은 또 이런 말도 덧붙였다.
“노태우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비서실장과 검찰총장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보자고 해도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대. 그건 공직에 있으면서도 돈을 단 한 푼도 먹지 않은 거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나중에 하는 생활을 보면 청렴한지 아닌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매일 아침 떠오르는 뉴스를 보면 어떤 연예인이 몇백억 원을 주고 아파트나 빌딩을 샀다는 것도 자주 나온다. 천문학적 숫자의 돈보다 청빈한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게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