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그간 반도체산업이나 게임회사 등의 연구 인력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주당 52시간을 유연성 없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지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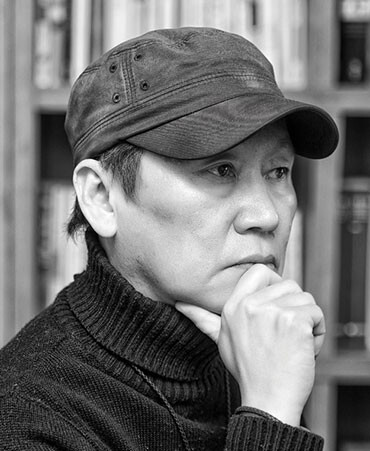
다만 영화나 드라마 산업 특성상 대부분 노동자가 1년 12달 365일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지는 않는다. 작품이 있을 때만 노동에 참여하는 프리랜서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관계기관이나 국민들이 이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처럼 날씨나 대기 상황 등을 통제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기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1년에 8~10개월 이상 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적게는 3~6개월만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많다.
즉 영화·드라마 산업 노동자들에겐 참여할 수 있는 노동기회가 여타 산업의 노동자들처럼 안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영화·드라마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연간 9개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산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2~3개월 휴가를 갈 수 있는 풍토가 돼야 산업이 더 매력적으로 비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법은 이런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타 산업 노동자들과 같은 잣대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왔다.
물론 주52시간 근무제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종국적으로는 주 4일 근무가 되든 4.5일 근무가 되든 일상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줄어들 게 자명하다. 그로 인한 산업의 재편이나 인식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현 시점 대한민국의 영화·드라마 산업에서 주 52시간 노동의 준수가 과연 산업이나 노동자 개개인에게 최선의 방법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영화·드라마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외산업으로 분류했다가 2018년 영화나 드라마 산업도 예외 없이 주52시간근무제를 준용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그 이후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작품을 배출하면서, 역사 이래 글로벌적으로 가장 사랑받았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후 치솟는 제작비 문제로 한국 콘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던 가성비라는 장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제작비 대비 효율이 높았던 장점이 어느덧 미국 다음 가는 제작비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됐다. 장점이 희석되기 시작하면 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기다. 주당 52시간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다 보니 영화·드라마 산업 종사자들은 절대적인 급여가 줄 수밖에 없다. 생활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아르바이트성 노동을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고정급여를 높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산업이 호황이고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구가한다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줄 수 있겠지만, 이미 한국 콘텐츠 산업 제작비는 미국 다음가는 고제작비를 자랑한다. 어느덧 가성비가 떨어지는 국가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화·드라마 산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라는 것이다. 이들은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산업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모든 여타 산업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건 한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노동자들과 합의를 전제로 작품을 제작하는 기간 동안 유연하게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모든 법이 모든 산업에 다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관계자들은 인식하길 바란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동연 영화제작자